漢書(82)에 한나라가 -108년에 설치한 낙랑군의 25현이 나오고, 三國志(289)에 그 낙랑군의 남쪽에 있던 삼한 78국이 나오며, 廣開土王陵碑(414)에 백제로부터 396년에 빼앗은 58성이 나오고, 日本書紀(720)에 왜가 369년에 점령한 임나의 7국과 4읍 등이 나오며, 三國史記(1145)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의 군현이 모두 나온다.
車峴과 竹嶺 그리고 炭峴에 의해 세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
...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역사


 ›
車竹以北 - 襄·壤·原 (들)
›
車竹以北 - 襄·壤·原 (들)
襄·壤·原은 벌을 훈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낙랑군 25현이나 삼한 78국 그리고 백제 58성에는 그것이 들어간 지명이 거의 없다. 고려에서 國襄, 故國川原, 東襄, 柴原, 中壤, 西壤, 好壤, 故國原 그리고 故國壤처럼 왕의 무덤이 있는 압록강 유역의 벌 이름으로 붙이기 시작해서 영토의 확장을 따라 차현과 죽령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하였다.
이 襄·壤·原은 차현과 죽령 이남의 지명에 붙은 卑離·夫里·伐·弗·火에 대응된다.
8439#27475
SIBLINGS
CHILDREN
OPEN
›
車竹以北 - 忽 (성)
고려가 지명을 짓는 방법은 □襄, □壤 그리고 □原에서 보는 것처럼 훈차한 한자 □에 襄, 壤 또는 原를 붙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忽은 기존의 지명에 忽을 붙이는 방식으로 □는 음차인 경우가 많다.
彌鄒忽은 백제의 彌鄒城을 고려가 차지해서 개칭한 것이고 奈兮忽은 백제에 奈兮란 지명이 먼저 있고난 후 고려가 차지해서 忽을 붙인 것이다.
따라서 □忽에서 忽은 고려가 붙인 게 분명하지만 □는 고려어가 아닐 수 있다.
8439#27373
SIBLINGS
CHILDREN
OPEN
 ›
車竹以北 - 忽(성)
›
車竹以北 - 忽(성)
삼국사기(1145)에 나오는 □忽은 압록강 이북에서부터 차현과 죽령에 이르기까지 넓게 나타난다. □城으로 호환되는 경우가 많아 忽은 城을 뜻하는 말을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차현과 죽령 이남의 지명에 벌을 뜻하는 卑離·夫里·伐·弗·火이 들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忽은 漢書(82)의 낙랑군 25현이나 三國志(289)의 삼한 78국 그리고 廣開土王陵碑(414)의 백제 58성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고려가 이 지역을 차지한 뒤 붙인 듯하다.
8439#8424
SIBLINGS
CHILDREN
COMMENT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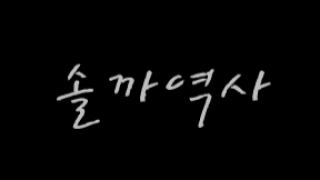 •
車竹以北 0475~0551
•
車竹以北 0475~0551
고려가 대동강 유역을 차지한 것은 313년이고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것은 475년이다. 영동 지역은 그 이전부터 차지했었다. 그러나 551년에 백제와 신라에 의해 한강 유역을 빼앗겼으니 고려가 車竹以北을 통치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한성만 놓고 보면 76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忽이란 지명은 고려가 기존의 지명에 忽만 붙인 것으로 □는 고려어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8439#27473
SIBLINGS
CHILDREN
COMMENT
27473

 ›
車竹以南 - 盧·邪·羅·奈·那·耶·良·洛
›
車竹以南 - 盧·邪·羅·奈·那·耶·良·洛
마한에는 盧가 6개 있었고 변진에는 盧가 2개, 邪가 2개 있었다. 반도의 재편 이후 마한의 萬盧와 변진의 斯盧는 각각 邁羅와 斯羅로 바뀌었고, 변진의 狗邪와 安邪는 백제에서 加羅와 安羅로 바뀌고 신라에서 加耶·加良과 阿耶·阿尸良으로 바뀌었다. 羅·奈·那는 백제식이고 耶·良·洛는 신라식이다.
고려와 왜 그리고 중국은 백제를 통해 이들 나라를 알게 되었으므로 백제식 표기를 썼다.
8439#24985
SIBLINGS
CHILDREN
OPEN
 ›
車竹以南 - 卑離·夫里·伐·弗·火 (들)
›
車竹以南 - 卑離·夫里·伐·弗·火 (들)
삼국지(289)에 나오는 마한에는 卑離가 붙은 나라가 8개인데 변진이나 왜 그리고 고려에는 없다. 삼국사기(1145)에는 夫里가 붙은 지명이 여럿 나오는데 거의 車峴以南이고 왜나 고려에는 없으며 신라에도 거의 없다. 따라서 비리와 부리는 시대의 차이에 따른 표기의 차이인 듯하다. 竹嶺以南에서는 지명에 伐·弗·火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벌은 들이라는 뜻으로 비리·부리와 발음이 비슷하다. 따라서 비리·부리와 벌·불은 벌을 뜻하는 같은 말에서 나온 듯하다.
8439#14719
SIBLINGS
CHILDREN
OPEN
 ›
車竹以南 - 伊 (함지땅)
›
車竹以南 - 伊 (함지땅)
豆伊→杜城→伊城, 富尸伊→伊城→富利 등의 예를 통해 □伊에서 □와 伊는 각기 독립적인 명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는 지명마다 다르므로 고유명사일 것이고 伊는 여러 지명에 공통되므로 보통명사일 것이다.
□伊란 곳의 지형을 보면 산간 분지가 많다. 따라서 보통명사 伊의 뜻으로 함지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직경이 5里가 안되는 작은 평지다.
8439#27123
SIBLINGS
CHILDREN
OPEN
 ›
車竹以南 - 兮 (내)
›
車竹以南 - 兮 (내)
草八兮(沙八兮)┆熱兮(泥兮)┆阿尸兮(阿乙兮)에서 나타나는 이칭을 통해 □兮에서 □는 고유명사이고 兮는 보통 명사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草八兮→八谿→草谿┆熱兮→日谿┆芼兮→杞溪┆所非兮→森溪┆阿尸兮→安溪┆芼兮→召溪에서 나타나는 명칭 변경을 통해 兮는 谿(溪)를 뜻하는 우리말을 음차한 것이고 谿(溪)는 그것의 훈차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1개의 □兮 중 6곳이 □谿(溪)로 바뀌었다.
그러나 반도에는 谿(溪)가 없는 곳이 없으므로 필연성이 없다.
8439#26879
SIBLINGS
CHILDREN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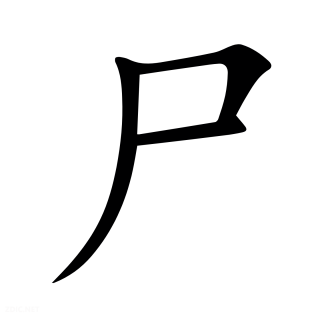 ›
車竹以南 - 尸 (사잇소리)
›
車竹以南 - 尸 (사잇소리)
尸는 현대 우리말에 나타나는 사이시옷의 원형으로 생각된다.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다른 말이 붙을 때 두 말 사이에 들어간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붙을 때는 ㄹ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발음이 편해진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붙을 때는 ㄴ이 들어간다. 이는 두 말의 결합을 표시한다.
이때 들어간 ㄴ은 나중에 떨어져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발음이 편하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8439#27143
SIBLINGS
CHILDREN
OPEN

•
동이는 말이 통했을까?
삼국지(289)에는 진한에 대해 진나라 유민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쓰는 말이 마한과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주서(636)에는 백제에서 왕을 어라하라 부르는데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 부여계 지배 세력과 마한계 피지배 세력의 언어가 달랐거나 한강 유역의 언어와 금강 유역의 언어가 달랐을 가능성을 열어준다.
8439#28676
SIBLINGS
CHILDREN
28676

-



 ›
車竹以北 - 襄·壤·原 (들)
›
車竹以北 - 襄·壤·原 (들)
 ›
車竹以北 - 忽(성)
›
車竹以北 - 忽(성)
 ›
車竹以北 - 買 (물)
›
車竹以北 - 買 (물)
 ›
車竹以北 - 達 (산)
›
車竹以北 - 達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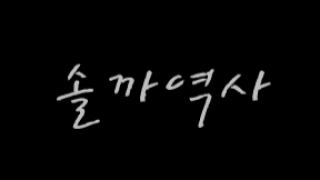 •
車竹以北 0475~0551
•
車竹以北 0475~0551

 ›
車竹以南 - 盧·邪·羅·奈·那·耶·良·洛
›
車竹以南 - 盧·邪·羅·奈·那·耶·良·洛
 ›
車竹以南 - 卑離·夫里·伐·弗·火 (들)
›
車竹以南 - 卑離·夫里·伐·弗·火 (들)
 ›
車竹以南 - 彌支·彌知·蜜地·馬知·馬渚
›
車竹以南 - 彌支·彌知·蜜地·馬知·馬渚
 ›
車竹以南 - 伊 (함지땅)
›
車竹以南 - 伊 (함지땅)
 ›
車竹以南 - 兮 (내)
›
車竹以南 - 兮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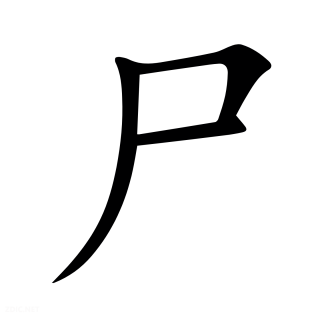 ›
車竹以南 - 尸 (사잇소리)
›
車竹以南 - 尸 (사잇소리)
